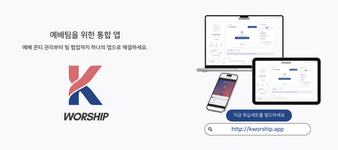속초1.3℃
속초1.3℃ 북춘천0.2℃
북춘천0.2℃ 철원-1.1℃
철원-1.1℃ 동두천0.3℃
동두천0.3℃ 파주-0.1℃
파주-0.1℃ 대관령-4.2℃
대관령-4.2℃ 춘천0.9℃
춘천0.9℃ 백령도-0.8℃
백령도-0.8℃ 북강릉2.8℃
북강릉2.8℃ 강릉4.3℃
강릉4.3℃ 동해3.7℃
동해3.7℃ 서울0.5℃
서울0.5℃ 인천-0.1℃
인천-0.1℃ 원주0.1℃
원주0.1℃ 울릉도-0.2℃
울릉도-0.2℃ 수원0.1℃
수원0.1℃ 영월-0.3℃
영월-0.3℃ 충주0.3℃
충주0.3℃ 서산-0.1℃
서산-0.1℃ 울진4.5℃
울진4.5℃ 청주0.5℃
청주0.5℃ 대전1.1℃
대전1.1℃ 추풍령-1.3℃
추풍령-1.3℃ 안동0.4℃
안동0.4℃ 상주0.8℃
상주0.8℃ 포항3.3℃
포항3.3℃ 군산1.2℃
군산1.2℃ 대구1.6℃
대구1.6℃ 전주1.9℃
전주1.9℃ 울산2.1℃
울산2.1℃ 창원4.3℃
창원4.3℃ 광주0.7℃
광주0.7℃ 부산5.3℃
부산5.3℃ 통영5.1℃
통영5.1℃ 목포1.1℃
목포1.1℃ 여수2.7℃
여수2.7℃ 흑산도2.6℃
흑산도2.6℃ 완도2.5℃
완도2.5℃ 고창0.1℃
고창0.1℃ 순천0.6℃
순천0.6℃ 홍성0.6℃
홍성0.6℃ 서청주-0.1℃
서청주-0.1℃ 제주4.6℃
제주4.6℃ 고산4.7℃
고산4.7℃ 성산4.6℃
성산4.6℃ 서귀포6.9℃
서귀포6.9℃ 진주3.7℃
진주3.7℃ 강화0.1℃
강화0.1℃ 양평1.0℃
양평1.0℃ 이천1.5℃
이천1.5℃ 인제-0.2℃
인제-0.2℃ 홍천0.0℃
홍천0.0℃ 태백-3.7℃
태백-3.7℃ 정선군-1.1℃
정선군-1.1℃ 제천-1.2℃
제천-1.2℃ 보은-0.2℃
보은-0.2℃ 천안-0.1℃
천안-0.1℃ 보령1.6℃
보령1.6℃ 부여1.8℃
부여1.8℃ 금산0.2℃
금산0.2℃ 세종0.2℃
세종0.2℃ 부안1.4℃
부안1.4℃ 임실0.6℃
임실0.6℃ 정읍0.3℃
정읍0.3℃ 남원1.0℃
남원1.0℃ 장수-1.6℃
장수-1.6℃ 고창군0.6℃
고창군0.6℃ 영광군0.6℃
영광군0.6℃ 김해시4.3℃
김해시4.3℃ 순창군0.2℃
순창군0.2℃ 북창원4.0℃
북창원4.0℃ 양산시4.7℃
양산시4.7℃ 보성군2.7℃
보성군2.7℃ 강진군2.8℃
강진군2.8℃ 장흥1.9℃
장흥1.9℃ 해남2.2℃
해남2.2℃ 고흥2.0℃
고흥2.0℃ 의령군2.8℃
의령군2.8℃ 함양군2.1℃
함양군2.1℃ 광양시3.7℃
광양시3.7℃ 진도군1.9℃
진도군1.9℃ 봉화-1.4℃
봉화-1.4℃ 영주-0.5℃
영주-0.5℃ 문경0.0℃
문경0.0℃ 청송군0.0℃
청송군0.0℃ 영덕2.2℃
영덕2.2℃ 의성1.5℃
의성1.5℃ 구미1.5℃
구미1.5℃ 영천1.6℃
영천1.6℃ 경주시2.0℃
경주시2.0℃ 거창1.4℃
거창1.4℃ 합천3.4℃
합천3.4℃ 밀양3.0℃
밀양3.0℃ 산청1.8℃
산청1.8℃ 거제4.1℃
거제4.1℃ 남해3.5℃
남해3.5℃ 북부산5.0℃
북부산5.0℃
 한국의 페블비치를 만들어나가는 아일랜드리조트 권모세 회장. 사진 = 세계TV DB
한국의 페블비치를 만들어나가는 아일랜드리조트 권모세 회장. 사진 = 세계TV DB
권모세(66) 아일랜드리조트 회장은 오래 전부터 골프에 대한 한 가지 꿈이 있었다. 미국의 페블비치처럼 한국에 자신의 손으로 명문 골프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그런 꿈을 꾼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페블비치’를 만들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물가조사기관 연구소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권 회장은 사업을 시작했다. 레미콘 사업이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제법 큰 레미콘 공장을 운영했고, 건설 붐에 힘입어 사업이 날로 번창했다.
경기 안산의 대부도에 공장 확장부지를 사뒀다. 골프는 남의 일로만 치부했지만 기업인 모임에 자주 나가면서 ‘골프를 안 할 수 없겠구나’고 생각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중 골프를 처음 접했다.
지역의 기업인들과 골프모임 약속 날짜가 잡혔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일주일 남겨두고 급하게 연습장을 찾았을 정도였다. 경기 성남의 남서울 골프장에서 처음 18홀을 돌았는데, 처음 간 골프장이 너무 좋았다. 인심 좋은 동반자와 캐디 덕에 그의 첫 스코어는 100타였다. 두세 차례 나간 뒤 곧바로 남서울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다. 이때부터 투어프로였던 김종덕, 최광수 프로에게 종종 골프를 배웠다.
그는 1990년대 초반 미국으로 거처를 옮겼다. 미국에서 10년동안 레미콘 사업과 무역업을 병행했다. 당시 워싱턴의 히든클리크 골프장이 집 근처에 있었는데, 3만 달러를 보증금으로 내면 가족 모두가 1년 내내 무료로 칠 수 있었고 보증금도 나중에 환불 받을 수 있었다.
권 회장은 이때부터 골프장 경영에 관심을 가졌고, 미국의 한 골프장에 지분 참여도 했다. 미국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온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안산의 대부도에서 골프장을 포함한 리조트 사업을 시작했다. 최고급 휴양시설로 대부도가 제격이었던 것. 미국의 한 어촌마을에 페블비치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일약 유명한 곳이 됐던 것을 염두에 뒀다. 이런 원대한 꿈을 안고 그는 ‘한국의 페블비치’로 대부도를 낙점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경관을 갖춘 바닷가 부지를 추가로 샀다. 이전에 레미콘 공장 부지로 땅을 사뒀지만 레미콘 사업은 접었고, 여기에 정규코스에 앞서 9홀짜리 연습장을 겸한 NCC클럽을 만들었다.
그의 베스트스코어는 77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인근의 뉴포트비치골프장에서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79타를 여러 차례 쳤다. 드라이버 거리도 한때 210m 정도를 보내며 남들에게 ‘비거리 달린다’는 소리는 안 들었다. 그러나 요즘은 골프 실력도, 비거리도 현저히 줄었다.
개장 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아일랜드골프장(27홀)에서 18홀을 쳐 본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평소에도 일만 하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도 원인이지만, 잔디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깝고, 경기보다는 코스 관리에 더 눈이 가는 바람에 골프 치는 재미가 반감됐다. 스코어 역시 90대 스코어가 고작이다. 그는 골프에 빠져드는 이유를 “스코어를 통한 경쟁도 있지만, 벙커를 고르거나 디봇을 메우는 행동을 통해 뒷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며 “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맛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골프장 오너와 달리 골프대회 유치를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회를 열고 있고, 한∙중 수교 10년 주년 기념으로 한∙중 국가대항전을 유치하기도 했다.
한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재벌기업과 제휴를 맺었지만 송사에 휩쓸려 낭패를 당하는 등 초창기 시련도 많았다. 또 회원제로 운영될 당시 회원 700명을 모집하려는 계획이 어긋나 자금난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한다. 만일 회원을 모두 채웠다면 골프장 경영수지를 맞추는 데 치명적 단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요즘 그는 글로벌 금융회사, 언론사 설립 준비와 함께 ‘한국의 페블비치’ 마무리를 위해 골프장내 빌라 단지 착공을 앞두고 정신 없이 바쁘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